살리는 교육, 죽이는 교육
  3면 3면  | 기사입력 2013-05-14 22:36 | 최종수정 2013-05-15 15:45 | 기사입력 2013-05-14 22:36 | 최종수정 2013-05-15 15:45 
 |
[한겨레] 한겨레 창간 25돌 릴레이 기고 ③ 생각하는 나라
인격 있는 교육
세 차례에 걸쳐 ‘인문학 강좌’를 할 기회가 있었다.(내가 최근에 낸 책 <철학을 다시 쓴다>에 담긴 뜻을 풀이하는 자리였다.) 첫 강좌 ‘좋음과 나쁨’은 반응이 괜찮았다. 그러나 ‘있음과 없음’은 신통찮았다. 마지막 강의인 ‘함과 됨’에서는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고 첫머리에 이상국 시인이 쓴 ‘국수가 먹고 싶다’를 읽었다. 시가 좋아서 이 자리에 고스란히 옮긴다.
“국수가 먹고 싶다 - 이상국
사는 일은 밥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라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 주는/ 국수가 먹고 싶다// 삶의 모서리에서 마음을 다치고/ 길거리에 나서면/ 고향 장거리 길로/ 소 팔고 돌아오듯/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 싶다// 세상은 큰 잔칫집 같아도/ 어느 곳에선가 늘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마을의 문들은 닫히고 어둠이 허기 같은 저녁/ 눈물자국 때문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 싶다.”
그러고 나서 “저도 흉내 시 한 편 썼어요. 들어 보실래요?” 물었더니 읊어 보란다. 으흠, 목을 가시고 나서 읊었다.
교수들을 만나면 형이라 부르자
교수형, 교수형…그리고 목매달자
“교수들을 만나면/ 형이라고 부르자/ 교수형, 교수형, 교수형……// 그러고 나서/ 목매달자.”
웃음이 터졌다. 내가 듣기에는 불온한 웃음이었다. 왜 그렇게들 웃어 댔을까? ‘교수’는 이 나라에서 가장 우러름 받는 직업이다. 그 ‘교수’들은 목매달자고 하는데, ‘우─’ 소리가 들려오는 대신 고개를 주억거리면서 웃는다?
그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은 ‘제도교육’에 길들여진 분들이다. 짧게는 6년, 길게는 20년이 넘게. ‘길든다.’ 얼마나 좋은 말인가! ‘길에 들어온다’, ‘입도’(入道), ‘수도’(修道), 그다음은 ‘득도’(得道) 아니면 ‘도통’(道通)이다. 득도하거나 도통하면 어디에 발 디뎌도 그게 길이다. 살 길이고 살리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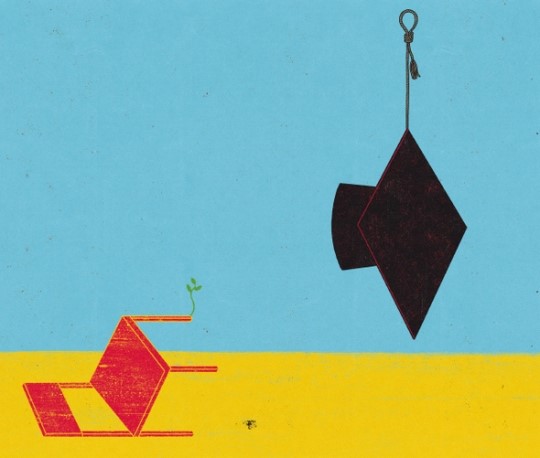 |
그런데 강산도 바뀐다는 10년이 훨씬 넘는 교육을 받고도 젊은이들에게 열린 길은 무엇인가? ‘백수’ 아니면 ‘비정규직’ 아닌가? 그 노릇 하려고 ‘길들여진다’? 그 마지막 길잡이가 ‘교수’다? 길들고 났더니 살 길이 안 보인다? ‘교수형’ 시켜 마땅한 게 아닌가?
철있는 사람이 철없는 사람들을 철들게 하고 철나게 하는 게 교육이고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자연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한 철, 한 철 접어들면서 ‘철이 들고’, 한 철, 한 철 나면서 ‘철이 난다’.
이른바 ‘제도교육’은 지난 200년 동안 후손들을 자연으로부터 격리시켜 ‘철없는’ 짓만 가르치는 데 힘써 왔다.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교육은 그래야 마땅하다고 우겼다. 그것이 바로 ‘길들이는’ 교육이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온 세상 다 둘러보라. 힘없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힘센 나라들이 세워 놓은 ‘메갈로폴리스’에 이르기까지. 살 길이 어디 있는가? 살릴 길이 어디 있는가?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계 전체가 죽을 길로 접어들고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 바르게 다스리는 일이다. ‘다스림’이다. ‘다사롭게’ ‘다 살리는’ 길이다. 자연에서는 그 몫을 ‘해’가, ‘태양’이 맡는다. 그래서 예부터 ‘통치자’는 ‘인민의 태양’, 곧 뭇 백성들을 철들게 하고 철나게 해서 살 길을 찾게 하는 빛이고 볕이었다.(해를 가리키는 ‘환웅’, ‘주몽’, ‘해부루’, ‘박혁거세’, ‘석탈해’……였다.)
글로 가르치고(敎), 기르는(育) 일이 ‘살리는’ 길이 아니라면 그 교육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삶’이란 무엇인가? ‘목숨’을 이어가는 게 먼저다. 목으로 드나드는 숨, ‘들숨’, ‘날숨’이 ‘목숨’이다. 목숨은 코로 입으로 드나드는 ‘바람’이다. 우리 목이 5분만 바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모두가 살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희망이다. ‘제도교육’에 이 바람이 통하는가? 희망이 있는가? 없다!
‘진리’가 무엇이고 ‘허위’가 무엇이냐고 묻지 말자. 어떤 때 ‘참말’이라고 하고, 어떤 때 ‘거짓말’이라고 하느냐고 묻자. ‘존재’가 무엇이고 ‘무’가 무엇이냐고 거드름 피우지 말자. ‘선’이 어떻고 ‘악’이 어떻다고 ‘공동선’이나 ‘공공의 적’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자. 주고받는 ‘말’과 하는 ‘짓’이 좋을 때가 언제고, 나쁠 때가 언제인지 가리게 하자. 이래야, 세살배기도 알아듣고 까막눈인 시골 어르신들도 알아듣는 말로 일러 주어야 참된 가르침이고, 좋은 교육이고, 모든 사람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주체로 모시는 민주정치가 바로 서는 길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입 발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다. 인류가 이 지구상에 나타난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본능에 기대서만은 살아남을 길이 없었다. 가르치고 배워야 했다. 지난 2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교육’의 가장 큰 스승은 자연이었다.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철 따라 심고 가꾸고 거두어야 살 길이 열림을 일러 주어 철들게 하고 철나게 했다. 그 가르침을 미리 철들고 철난 마을 어른들이 거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본주의 산업문명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 청부업자’들은 교육에 발붙일 길이 없었다.
제도교육서 너는 체제의 나사못
우리는 나사못 깎는 기계공일 뿐
교육의 궁극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도 ‘생명체’이므로 목숨 붙이고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어렸을 적부터 열심히 손발 놀리고(놀게 하고), 몸 놀려서(놀게 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 마련할 몸을 만들고 마음가짐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 지금 ‘교육자’들이 이 짓 하고 있는가? 혹시 ‘교과서’를 달달 외우고 하나밖에 없는 ‘정답’을 족집게처럼 짚어내면, 머리만 잘 굴리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정말 삶의 문제에 정답이 하나뿐인가? 사람은 혼자서 제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생명체로 태어나지 못했으므로, 서로 도우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모여 살아야 하고, 말을 주고받아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삶에 ‘정답’이 있으면 그것을 서로 알려 주어 다 같이 함께 살아야 한다.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알려 줄 생각도 말고, 아는 사람한테 물을 엄두도 내지 마라.’ 이게 살 길, 서로 살릴 길을 일러 주는 ‘교육’인가?
‘교육의 궁극 목적은 개체 생존 유지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성에 기초한 협동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이렇게 힘있는 ‘먹물’들이 힘센 나라에서 밀수입해 온 어려운 학문 사투리로 써야 왕년의 대학교수답겠지. 그래서 ‘교수형’ 감이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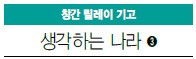 |
지금 제도교육 현장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 나도 이런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고 시켜 본 적도 없다. 현재 제도교육은 사람과 자연이 서로 돌보지 않아도, 자연은 이용만 하더라도, 나무와 숲을 불태워서라도, 다른 살아 있는 것들이 모두 목숨을 잃더라도 사람끼리만 살아남을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자고 꼬이고 있다. 그러나 그럴 길이 있는가? 농사지어 본 사람은 안다. 밀도, 보리도, 벼도, 콩도, 옥수수도, 사람도 혼자 살 길이 없다. 사람도 집짐승도 이걸 먹지 않고는 살 길이 없는 이 낟알들도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해마다 거두어서 다음 해에 땅에 묻어 주어야 되살아난다. 사람들은 이 낟알들에 기대어 살고, 이 낟알들도 사람이 돌봐야 살 길이 열린다. 왜 사람만이 희망인가? 목숨으로 드나드는 바람도, 우리 몸 안에서 흐르는 물도, 피를 덥히는 햇살도, 온갖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에 쓸모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는 땅도 희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보리와 강냉이의 희망을 노래하면 어디 덧나나?
지난 3월25일에 경북지역 자율형사립고에서 전교 1등을 하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렸다. ‘내 머리가 심장을 갉아먹는데 이제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한다. 이게 우리 교육현실이다.
‘마음은 둘 데 없더라도 머리만 써라. 몸도 손발도 제때 제대로 놀리지 못해서 ‘강시’나 ‘좀비’가 되더라도 머리만 잘 굴리면 돼.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건 ‘자본주의 인력시장’이야. 너는 사고파는 체제의 나사못일 뿐이야. 우리는 ‘권력과 체제 지킴이’이고, 나사못 깎는 기계공일 따름이야.’ 이 학생이 들었던 말은 ‘환청’이었을까?
일흔이 넘은 이 나이에도 나는 아이들과 놀고 싶다. 온몸으로 놀고 싶다. 열심히 손발 놀리고 몸 놀리게 해서 이 세상에 쓸모 있는 ‘부지런한 일꾼’으로 기르고 싶다. 자연 속에서 철들고 철나는 철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싶다. 함께 배우고,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고 싶다.
|